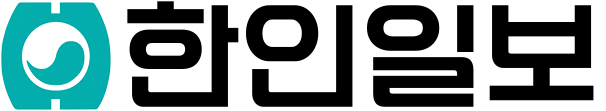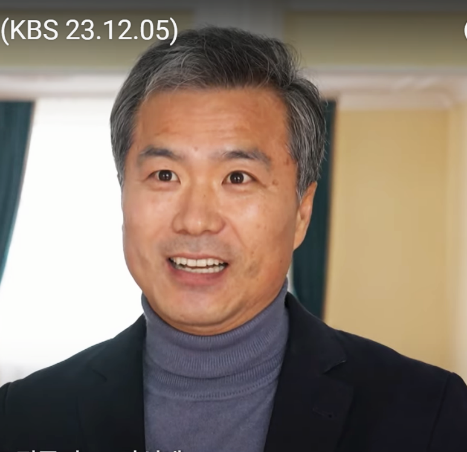[카프카스 여행기 1 – 아르메니아]
카프카스 3개국 중 아르메니아와 조지아를 여행하였다. 이번 여행을 통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들의 문화를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단순여행정보를 나열한 글은 아니고 필자가 보고 느낀 감상을 적은 지극히 개인적인 글이다. 틈틈이 정리해서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아라라트 꼬냑의 나라,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는 카프카스산맥에 있는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남카프카스에 있는 작은 국가이다. 남쪽으로 터어키와 이란과 국경을 접하고 있고 북쪽과 동쪽으론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쟌을 이웃국가로 두고 있다. 우리에게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있다면 아르메니아인들에겐 아라라트산이 있다. 비록 터어키 땅에 속해 있어서 쉽게 갈 수는 없지만 수도 예레반의 어느 곳에서도 눈덮힌 아라라트 산을 볼 수 있다. 국토면적은 경상도 만하고 인구는 300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
우리가 대륙의 정세변화에 따라 역사적 부침을 경험했지만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유지해온 것처럼 아르메니아인들도 자신들의 문자와 언어를 사용하면서 문화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영국의 수상 처어칠이 즐겨마셨다는 아라라트 코냑의 고향이고 이웃나라 조지아와 함께 카프카스 음식의 본향임을 자부하는 이들이 사는 땅, 아르메니아를 다녀왔다.
기원전 782년에 시작된 도시, 예레반

수도 예레반은 ‘잘 보인다’ 또는 ‘전망이 좋다’라는 뜻을 가진 아르메니아의 수도이다. 방사형 도시인 예레반에서 제일 먼저 볼 것은 단연코 카스카드 조각공원에 올라서 아라라트 산을 조망해 보는 것이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우리 민족의 영산 백두산과 같은 위상을 지니는 산이 바로 아라라트 산이다. 노아의 방주가 걸린 곳이라는 사실을 떠나서 하얀 눈을 머리에 이고 있는 아라라트 산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탄사를 연발하게 만든다.
현재의 도시 모습은 1920년에 계획된 것이고 주요건물들은 1930년대에 건축되었다. 10개의 역을 갖춘 지하철이 운행되는 예레반에는 150만명이 살고 있다. ‘장미의 수도’라는 또다른 이름 가진 도시 답게 깨끗하고 고풍스러우면서도 정이 넘친다.
예레반 시내투어는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데, 노천카페에서 여유있게 식사를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만약 그들과 눈길이 부딪혔다면 피하지 말고 살짝 웃어주자. 그러면 그들은 길을 가는 여행자에게 기꺼이 자리를 내어주면서 와인이나 아라라트 꼬냑을 한잔 따라 줄 것이다.
나도 이번 여행에서 이런 경험을 하였다. 숙소에 여장을 풀고 점심을 먹기 위해 길을 나서기를 5분쯤 경과할 무렵, 노천카페에서 식사를 하던 현지인들이 천천히 길을 걸어가든 우리 일행에게 질문공세가 이어졌고 우리가 한국에서 왔음을 알고는 그때부터 꼬냑과 와인을 연거푸 권하는 것이 아닌가? 덕분에 나는 대낮에 코냑 2잔을 연거푸 마시게 되었고 동료들은 그런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면서 결국 예초에 예정된 식당이 아니라 그곳에서 점심을 먹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나는 좌장인 듯한 분에게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신 모양이다면서 대낮부터 노천카페에서 술 파티를 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 좌장인 듯한 분은 자신이 아르메니아국립 오페라하우스의 총감독이라고 먼저 소개한 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와인은 생활음료이라면서 여행중에 이런 풍경을 자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줬다.
아르메니아 음식과 고기 굽는 방법에 대한 얘기며 남북한의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으며 복숭아 수제 보드카와 석류와인도 맛보다 보니까 마치 오래된 친구와 함께 하는 식사자리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가까워져 버렸다. 나와 계속 식사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그들을 뿌리치고(?) 난 일행들이 식사를 하는 옆테이블로 돌아왔지만 지나가는 여행자들에게 미소를 띤 얼굴로 와인 한잔을 권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아르메니아인들이구나 하는 강한 인상을 받았다.